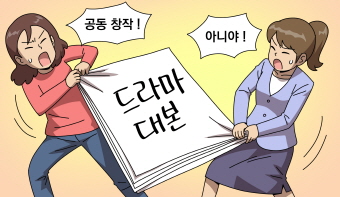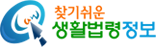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고샛별 : 그것은 공동저작물이 아닙니다. 공동저작물이기 위해서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나와 당신간에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의사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고, 더욱이 당신은 제작사 왕대표에게 당신이 쓴 부분에 대해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극본은 공동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그것은 공동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7회 이후의 극본이 공동저작물에 해당되면, 고샛별 작가가 제작사에 극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김사랑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것’과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작업실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동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저작권법위반])
서로 함께 창작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제 극본 작업을 함께 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에서의 드라마극본은 김사랑씨가 쓴 7회까지의 극본과 고샛별씨가 집필한 8회부터 30회까지의 극본이 합쳐진 단일한 극본으로 ‘이별 뒤 사랑’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위한 극본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회까지의 극본을 혼자서 완성한다는 것이 극본집필계약의 내용이었고, 또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자신의 기존 작업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던 김사랑 작가의 대응에 비추어 볼 때, 두 작가 사이에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1회부터 7회까지는 김사랑 작가의, 그 이후는 고샛별 작가의 단일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일 저작물이 되면, 그 부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두 작가가간에 잘 화해해서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평결일 : 2016년 10월 1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